입력 : 2011.03.14 23:32 / 수정 : 2011.03.15 09:47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간 이식 10건 중 9건이 가족끼리 주고 받아
사위가 장인·장모에게 기증하는 사례도 늘어
첫사랑 여인, 前남편 등 별별 사연들이 넘쳐
지난해 봄 어느 날 서울 한 대학병원 장기이식센터 병동이 발칵 뒤집혔다. 그날 아침에 수술받기로 한 젊은 남자가 밤사이 사라진 것이다. 그 남자는 자신의 간(肝) 절반을 떼는 수술이 예정돼 있었으나, 야반도주를 했다. 그는 기실 '환자'가 아니었다. 간은 멀쩡했다. 역설적으로 그는 그 이유로 수술대에 서야 했다.
간 수술은 아버지 때문이었다. 오랫동안 간경화증을 앓아 온 아버지는 간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간 이식 외에는 살 방법이 없었다. 뇌사자 장기이식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하세월이었다. 더 기다리다가는 아버지 생명이 위태로울 판이었다. 아버지가 살려면 아들 형제 두 명 중 한 명이 간을 내놔야 했다. 살아 있는 사람의 간을 절반 나누는 '생체(生體) 간 이식'이다. 간은 재생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절반을 떼내도 나머지 절반이 제법 커지면서 제 기능을 다 한다.
동생은 아버지와 혈액형이 달랐다. 선택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형이 수술대에 누워야 했고, 그는 수술 날짜에 맞춰 병원에 입원했다. 주변에서는 효심(孝心)이 뛰어난 아들이라고 칭찬이 자자했지만, 그에게는 숱한 고민이 밀려왔다. 만약 수술이 잘못돼 내가 위험해지면, 나와 처자식은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수술실로 들어갈 시간이 다가오면서 두려움이 몰려 왔을 것이다. 결국 그는 바닷속 용궁을 빠져나온 '토끼'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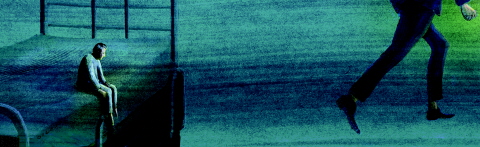
- ▲ 일러스트=정인성 기자 1008is@chosun.com
가족 간 기증은 시대 조류를 반영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간을 기증하는 경우가 제법 있었다. 시집 온 여성도 한 식구이니,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럴 경우 처가 식구들의 마음이 묘했을 듯싶다. 요즘에는 사위가 장인·장모에게 간을 내놓는 경우가 늘었다고 한다. 간 기증에도 모권(母權) 사회의 기류가 엿보인다.
가족 관계가 아닌 순수 기증에는 별의별 사연이 다 있다. 그 중 압권은 남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 첫 사랑의 여인에게 간을 내준 경우다. 딱한 처지를 전해 들은 이 총각은 옛 애인을 살리기 위해 수술대에 누웠다. 남자의 순애보(純愛譜)란…. 반대로 이혼한 부인이 새 장가를 간 전(前) 남편에게 간 기증을 한 경우도 있었다. 이미 갈라선 전 남편에게 무슨 정이 남았겠느냐마는, 어린 친자식을 전 남편이 맡아 키우는 데 경제력이 있는 아빠가 잘못될 경우 아이들 장래가 걱정됐던 것이다. 모성(母性)이란 이런 것인가 보다.
드물게는 불법 장기매매를 순수 기증으로 위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같은 교회나 절 또는 회사에 다니면서 가족처럼 지내왔기 때문에 순수 기증에 나선다고 이식 신청 서류를 낸다. 이를 위해 신도 증명서나 재직 경력서를 위조하기도 한다. 이식 승인 심사를 받기 전에 서로 입을 맞추려고 합숙 훈련까지 한다. 한쪽에서는 돈을 위해 필사적으로 주려고 하고, 한편에서는 부자지간에도 주저하니, 이게 다 간 때문이다.
혈액형 불일치 등으로 가족 기증을 할 수 없을 때는 같은 처지의 다른 환자 가족과 간 맞바꾸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교환 이식이다. 이럴 때는 두 가족의 환자 2명과 기증자 2명이 같은 날 수술실에 동시 입장한다. 먼저 간을 받은 가족이 나중에 간 기증을 기피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간인데, '간 계(契)'가 깨져서야 되겠는가.
서구 나라들에서는 가족 간 기증이더라도 아무런 제약이나 압박 없이 기증이 이뤄졌는지 철저히 따진다. 가족보다 개인의 자유 선택 의지를 더 중요히 여기기 때문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 누구를 '심리적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홍헌표의 암환자로 행복하게 살기] [3] 마음 비우는 법 가르쳐 준 癌 (0) | 2011.04.01 |
|---|---|
| 비만과 친한 질병 (0) | 2011.03.27 |
| [3·11 일본 대지진] 백혈구 파괴해 면역기능 상실… (0) | 2011.03.15 |
| 고지혈증이란? (0) | 2011.03.09 |
| [스크랩] 수명을 늘리는 것과 줄이는 것 (0) | 2011.02.22 |